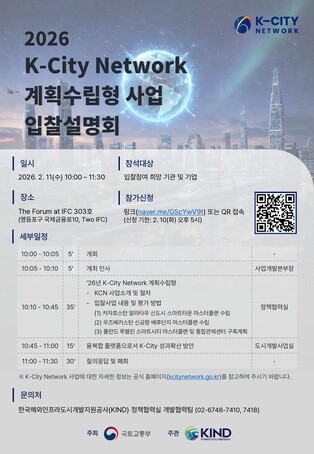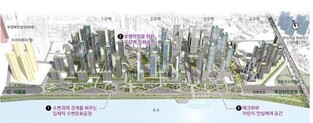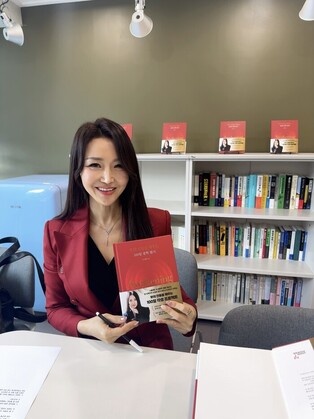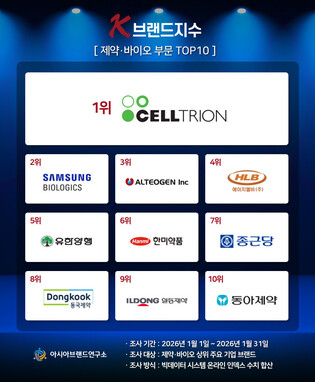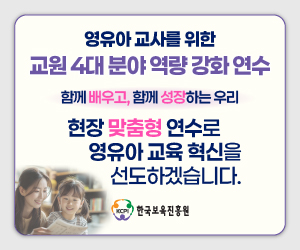‘제로페이’가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에 여당까지 일찍부터 추임새를 넣으며 제로페이 띄우기에 나섰지만 활성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이다. 흔히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불린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이 신용결제를 통해 물건 및 서비스 대금을 받을 때 내는 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탄생한 결제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소상공인은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0.5% 한도의 소액만 지불하게 된다. 연매출 8억 이하면 수수료가 제로이니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명실상부한 제로페이라 할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news/data/20190315/p179565874635517_601.jpg)
제로페이를 정착시키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특히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당사자인 박 시장은 제로페이 정착에 정치인으로서의 명운을 건 듯 보인다. 그만큼 적극적이란 얘기다.
박 시장의 제로페이에 대한 열정은 지난해 12월 있었던 제로페이 출범식에서부터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결제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용확산 결의대회’ 및 제로페이 출범식에서 박 시장은 “제로페이가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제로페이 활성화를 독려했다.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40%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향후 신용결제 기능, 포인트 제도 도입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행사 후 상점에 들른 박 시장은 손수 제로페이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며 “정말 쉽다”, “간편하다”를 연발했다. 사용시 혜택만 많은 게 아니라 이용 절차도 간단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주입시키려는 행동이었다.
절차가 간편한지 여부는 제쳐두고, 지금까지 드러난 제로페이 관련 혜택을 살펴보면 가짓수가 한둘이 아니다. 앞서 홍 장관이 언급한 것 말고도 비록 자잘한 것들이긴 하지만 다양한 혜택들이 제시돼 있다. 우선 세종문화회관 입장료 및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관람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이용료 10~30% 할인 혜택을 꼽을 수 있다. 나아가 서울대공원 입장료와 공공주차장 이용료,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이용료 결제를 제로페이로 할 수 있게 된다.
박 시장 개인의 정치적 야망 때문이든, 소상공인을 위하는 진정어린 선의 때문이든 제로페이 정착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거의 필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영 시큰둥하다.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사용하고자 해도 아직 사용자체가 불가능한 상점이 대부분이다. 상인들 중엔 아예 제로페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이용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들의 외면이다.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제로페이가 사실상 현금 결제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 점이 제로페이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다. 외상(신용)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월급날 이후 특정한 날짜에 몰아서 결제를 하는 습관에 젖은 보통 사람들에게 사실상의 현금 결제는 부담스러운 행위다. 제로페이는 결제 즉시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상점 주인(가맹점주)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로페이를 쓸 바엔 체크카드를 쓰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어차피 결제 즉시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사용절차가 훨씬 간편한 체크카드를 쓰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처럼 카드를 긋는 체크카드와 달리 제로페이는 앱을 열어, 제로페이 메뉴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QR코드를 사진찍은 다음, 결제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절차를 거친다.
제로페이가 갈 길은 먼 듯 보인다. 민간기업의 장기 투자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착된 신용카드 제도와 달리 제로페이가 급조된 관치의 산물이라는 점이 기본적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제로페이의 취지는 좋지만, 서울시가 시장의 반응과 공정경쟁 원리마저 무시해 가며 더 이상 무리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