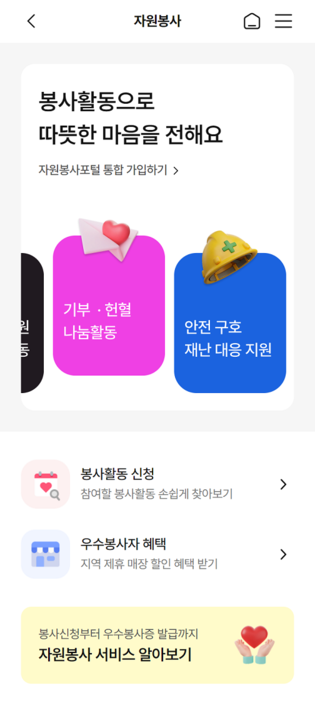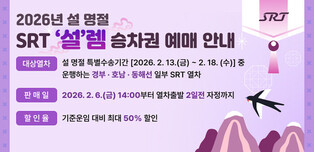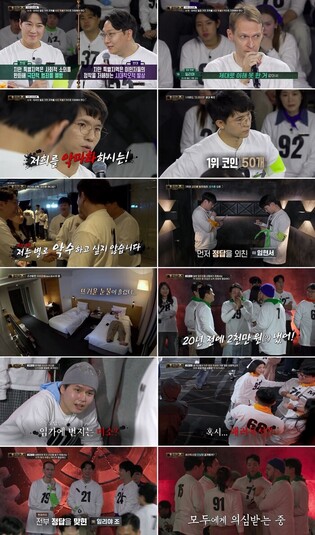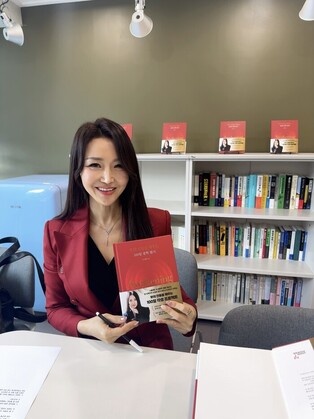자본건전성 확보 및 ESG경영 실행력 강화
조달 자금 녹색 프로젝트와 사회적 프로젝트 사업에 전액 투자
 |
| ▲ KB손해보험 사옥 전경[사진=KB손해보험 제공] |
KB손해보험이 신지급여력비율 제도 도입에 대비해 2860억원 규모의 후순위 공모사채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을 발행했다. 조달된 자금은 녹색 프로젝트와 사회적 프로젝트 사업에 전액 투자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대표이사 김기환 사장)은 13일 신지급여력비율(K-ICS) 제도 도입에 대비해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을 위해 2860억 원 규모의 후순위 공모사채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지속가능채권은 10년 만기, 5년 콜옵션 후순위 채권으로 KB손해보험의 RBC(지급여력) 비율은 약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손해보험은 조달된 자금을 ▲신재생 에너지 생산 ▲친환경 건축물 확대 ▲생물 다양성 보전 등 녹색 프로젝트와 ▲고용 창출 ▲취약 계층과 서민층 주거지원 등 사회적 프로젝트 사업에 전액 투자함으로써 ESG경영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채권 발행을 앞두고 한국기업평가㈜에서 실시한 ESG인증평가에서 KB손해보험 지속가능채권은 최고 등급인 ST1을 받았다.
한편, KB손해보험은 2020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IB사업이란,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투자의 한 형태로서, 정책과제를 위탁 받은 민간 업체가 범죄, 빈곤, 교육, 문화 등의 복지사업을 벌여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문제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으로, KB손해보험은 지난 3년 동안 SIB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KB손해보험은 2021년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의 PSI(Principles of Sustainable Insurance, 지속가능보험원칙)에 가입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국가적·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KB금융그룹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지침을 자산운용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ESG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