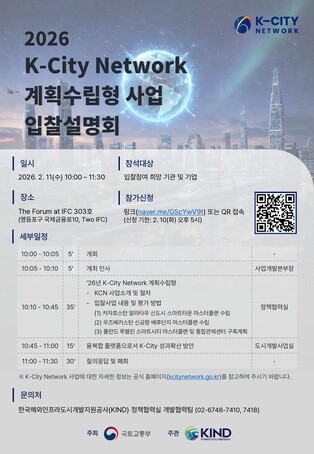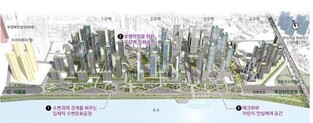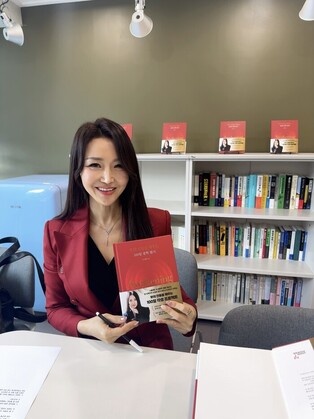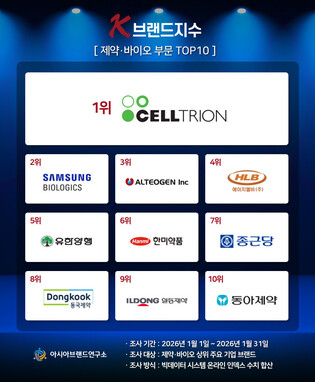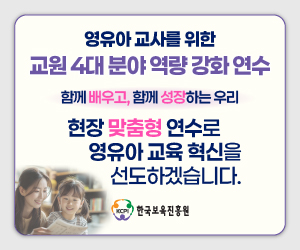[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경유 미세먼지 논란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과연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전제가 맞는지부터 차근차근 따져보자는 주장이 서서히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자동차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산돼가고 있다. 나름대로의 논거도 확보돼 있다.
경유값 인상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 첫째는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환경부 등 정부의 주장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경유 미세먼지나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등 다른 연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에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새로이 드러났다. 2009년 지식경제부(당시 명칭)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의 연구('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가 그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가 1km를 주행할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경유 0.0021g, LPG 0.0020g, 휘발유 0.0018g, CNG 0.0015g 등이었다. 경유 미세먼지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 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수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중 일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논할 때 경유 미세먼지 등 매연만을 다루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료가 탈 때 발생하는 매연보다 오히려 타이어와 아스팔트 바닥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더 큰 대기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경유값 인상에 의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다. 음식점의 육류 직화 구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경유값 인상이나 직화구이 규제가 영세한 용달차 운송업자나 개인 음식점 등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게 그 이유였다.
정부가 에너지 효율성 차원에서 경유차 운행을 제도적으로 권장해오다 이제 와서 갑자기 경유값을 올리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내 일각에서는 경유값을 올리기보다 휘발유값을 내려 경유차 운행을 자연스레 줄여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만큼 무리한 주장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