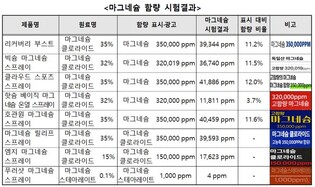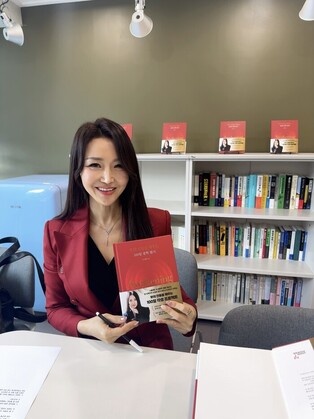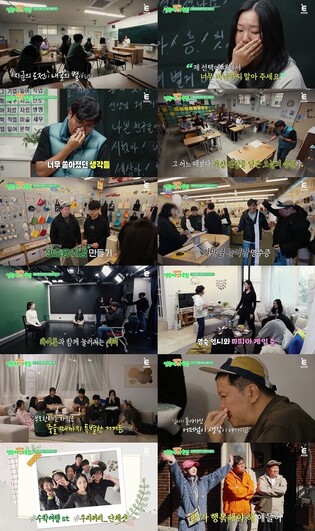근로복지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213명에서 2020년 581건으로 3년 만에 172.8% 증가했다. 2021년에는 9월 기준 523건이 접수됐다. 승인률도 2017년 59.2%에서 2021년 9월 기준 72.7%로 상승했다.
이렇게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업무상 질병에 비하여 그 절대적인 신청 건수는 저조한 게 현실이다. 이번에는 정신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 ▲ [사진=픽사베이 제공] |
정신질병이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다.
정신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그 심각도와 개인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병 간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 폭언·폭력·성희롱, 민원을 받거나 고객과의 갈등이 있었는지, 해고, 복직, 인사조치 등 고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갈등이 있었는지, 상사, 동료, 부하, 원·하청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하였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이 있었는지 등이 있다.
이때 사건 자체의 강도와 크기 등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주관적 충격의 정도를 감안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처리과정에서의 적절한 지원과 지지 유무, 근로자 보호가 가능한 체계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신질병 산재 신청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입증인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사업주,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진술, 이메일, 문자, SNS, 일기 등 포괄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질병의 경우 사회적 편견, 입증의 어려움, 산재 처리 기간의 장기화 등의 이유로 다른 업무상 질병보다 산재 신청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업무로 인하여 정신질병이 발병하였을 시에는 적극적인 청구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소망 공인노무사 현은진]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